풍속화, 삶을 기록하다
‘풍속’은 상풍하속(上風下俗)의 줄임말이며, 풍(風)은 지배층의 입장에서 바라본 백성의 생업활동으로
국왕이 백성의 고충을 헤아려 선정을 베풀도록 유도한다는 감계적(鑑戒的)인 성격을 지닌다.
속(俗)은 피지배층인 백성의 다양한 삶을 대상으로 하며, 18세기에 성행한 한국적 풍속화는
통속적(通俗的)이었기 때문에 속화(俗畵)라고도 했다. 특히 풍속화는 문자로 된 기록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생업, 실내장식, 의례, 복식, 유희 등의 장면을 시각적 조형 언어로 표현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각 자료이다. 내용이나 목적에 따라 고구려 고분벽화나 조선시대 감로왕도(甘露王圖)에 그려진 것처럼
신앙이나 종교적인 것, 무일도(無逸圖), 빈풍도(風圖), 경직도(耕織圖) 등 국왕이 선정을 펴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것, 양반이나 백성의 생활상을 그린 통속적인 것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된다.
고구려 고분벽화부터 풍속적인 요소가 강한 그림들이 그려졌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실학적 태도를 취한
문인화가 윤두서(尹斗緖)와 조영석(趙榮祏)이 진정한 의미의 초석을 마련했다. 그리고 김홍도(金弘道),
신윤복(申潤福), 김득신(金得臣)이 해학 풍자 익살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의 인간적인 정서를
표현하면서 한국적인 풍속화가 완성되었다. 이후 김양기(金良驥), 이수민(李壽民), 유운홍(劉運弘),
이형록(李亨祿), 유숙(劉淑), 백은배(白殷培) 등에 의해 지속되었지만, 소재와 표현기법 등에서 현저한
수준 차이를 보인다. 19세기 말에 김준근(金俊根)이 원산, 부산, 제물포 등의 개항장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그려 판매한 형식화된 그림들이 풍속화의 대미를 장식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윤두서의 〈채애도(采艾圖)〉(개인), 조영석의 《사제첩(麝臍帖)》과 〈현이도(賢已圖)〉
(간송미술관), 강희언(姜熙彦)의 〈사인삼경(士人三景)〉(개인),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국립중앙박물관),
신윤복의 《혜원전신첩(蕙園傳神帖)》(간송미술관), 김득신의 〈파적도(破寂圖)〉(간송미술관) 등이 있다.


신윤복(1758~?/조선 후기) 단오풍정(종이에 채색/28.2×35.6cm/18세기 말~19세기 초)
공판화, 티셔츠 그림부터 예술 작품까지! (1)
평판화, 새기지 않고 찍어내는 예술
유클리드가 제시한 세상의 규칙은 어떻게 원근법의 토대가 되었을까?
공공 미술, 미적 자율성과 공공성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색이란 무엇인가?
가산 혼합, 감산 혼합: 무엇을 더하고 빼는 걸까?
미술사 끝판왕 사이트, 왜 무료로 공개할까?
판화의 넘버링, 예술의 희소성과 대중성 사이
상상화란 용어는 어디서 왔을까?
추상 미술은 하나의 유파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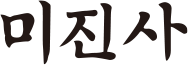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