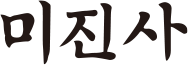스마트 폴리: 예술과 기술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판형: 190*245mm
페이지: 304쪽
도서상태: 정상
책 소개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 중 하나인 ‘인문사회분야 공동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진행된 ‘DMZ의 스마트 폴리 구축을 위한 융복합 연구’의 결과물 중 하나이다. 연구 과제명은 ‘DMZ의 스마트 폴리 구축’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 책의 연구 범위는 DMZ에 집중하기보다는 스마트 폴리 일반의 문제로 확장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DMZ 공간을 재구축할 때 디지털 기술은 전쟁의 기억을 보존하고, 생태적 기능 및 심미적 풍경으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DMZ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닌 폴리 공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 과정은 공간의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개방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접근을 반영한다. 또한 건축, 디자인, 미술 비평, 철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공통된 문제의식하에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공간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다각도로 탐구하며, 폭넓은 독자층을 위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 소개
고경호
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교수.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거쳐 미국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 School of Visual Arts)에서 미술학 석사 학위를 받고 국민대학교 건축디자인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는 제1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등이 있다. 15회의 국내외 개인전 및 150여 회의 단체전을 통해 조각, 미디어, 회화, 설치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건축, 공학, 미술의 융합연구를 통해 새로운 작품 및 연구를 진행 중이다. 주요 작품으로는
<클레오파트라의 바늘>, <흰 코뿔소 여정>, <리플렉션 시리즈> 등이 있다.
박영욱
현 숙명여자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고려대학교 철학과 및 동 대학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한양대학교 작곡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등에서 강의했으며 저서로는 『철학으로 현대음악 읽기: 바흐에서 전자음악까지』(바다출판사, 2018), 『보고 듣고 만지는 현대사상: 예술이 현생해낸 사상의 모습들』(바다출판사, 2015), 『필로아키텍처: 현대건축과 공간 그리고 철학적 담론』(향연, 2009), 『데리다와 들뢰즈: 의미와 무의미의 경계에서』(김영사, 2009), 『매체, 매체예술, 그리고 철학』(향연, 2008), 『스마트 쉘터 공간 2: 디지털 기술은 어떻게 기여하는가』(미진사, 2020) 등이 있다.
정연심
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교수. 2018-2019 풀브라이트 펠로우(Fulbright Fellow)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 광주 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Imagined Borders》의 큐레이터로 참여했다. 미국 뉴욕대학교의 인스티튜트 오브 파인아트(IFA, Institute of Fine Arts)에서 미술사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뉴욕주립대(FIT,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조교수를 역임하고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최된 《백남준 회고전》의 리서치로 근무했다. 주요 저서로는 『Collision, Innovation, Interaction: Korean Art from 1953』(공저, 파이돈, 2020), 『비평가, 이일 앤솔로지』(공편, 미진사, 2013; Lee Yil: Dynamics of Expansion and Reduction, Paris: Les press du réel, 2018), 『Lee Bul Dissident Bodies』(공저, Hayward Gallery, 2018), 『현대공간과 설치미술』(에이엔씨, 2014) 등이 있다.
이대철
현대미술작가. 설치, 조각 위주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영국 런던예술대학교(UAL,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Chelsea])에서 미술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6회의 국내외 개인전 및 100여 회의 단체전을 통해 설치, 조각, 미디어, 회화 등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국내외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전시 및 공연 기획을 하고 있다. 형상 언어, 사운드 아트, 공공 미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작품 및 연구를 진행 중이며 예술을 통한 사회적 문제해결과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Love-side of Love>, <You Make Me>, <Comfort Woman> 등이 있다.
김맑음
큐레이터이자 미술이론가. 홍익대학교 예술학, 건축공간예술 융합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시대 미술계에서 건축 이론과 예술이 접점을 이루며 발생하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서울시청 문화본부, 미국 보스턴미술관 아시아미술부를 거쳐 현재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학예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획 전시로는 《칼레이도 Kaleido》(DDP 갤러리문, 2024), 《선셋 벗 라디언트 Sunset but Radiant》(프레임성수, 2023), 제10회 아마도전시기획상 《윈도우 리컨스트럭션 Windows Reconstruction》(아마도예술공간, 2023) 등이 있다.
김윤아
현 홍익대학교 조소과 강사.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경력인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경기창작센터, 박수근미술관, 미국 버몬트스튜디오센터(Vermont Studio Center), 대만 피어투아트센터(Pier-2 Art Center) 등의 레지던시 작가활동과 9회의 국내외 개인전, 다수 기획전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실과 선의 조각과 설치 미술을 선보이고 있다.
김채린
현 부산대학교, 강원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강사.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몸의 기억을 간직한 조각작품을 통해 조각의 다양한 소통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2021년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경기도미술관×경기창작센터 퀀텀 점프, 2019년 OCI 미술관 영크리에이티브스, 2018년 김종영미술관 창작지원 작가로 선정되었다. 《서로에게 기대서서》(눈 컴템포러리, 2024) 외 5회의 개인전과 《여기 닿은 노래》(아르코미술관, 2024), 《조각충동》(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22) 외 80여 회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김태현
큐레이터.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석사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2017년 교토 익스페리먼츠(Kyoto Experiments)의 ‘개성공단’, 2019년 통일부의 ‘DMZ ART and Peace Plarform’, 2021년 통일교육원의 ‘DMZ 사람들’, 2023년 경기도의 ‘DMZ Check point’ 팀과 함께했다. 그리고 2022년 전시 오두산통일전망대의 ‘합류지점’을 기획했고, 현재 박사 논문으로 DMZ의 예술 활동에 대하여 연구 중이다.
김한들
큐레이터이자 미술이론가. 뉴욕주립 빙햄튼대학교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홍익대학교 예술학과에서 강의하고 국민대학교 미술관・박물관학과 겸임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사진예술과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윤석남, 이우성, 이승택 개인전 등 다수 전시를 기획 및 진행하고 제3회 제주비엔날레 리서처, 현대미술사학회 출판 간사로 일했다.
이재원
현대미술작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리토폴로지》(디스위켄드룸, 2019), 《구체풍경》(스페이스바, 2019), 《두터운 세계》(현갤러리, 2010) 등 4회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20여 회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조각을 중심으로 설치,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신체 경험의 비의식적 영역에 대한 관심을 주제로 작품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주현
현대미술작가.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비정형의 몸을 주제로 한 설치 및 조각 작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이충현
현 홍익대학교 강사이자 현대미술작가. 홍익대학교 조소과 및 동 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을 졸업했으며, 홍익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난지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4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한 바 있다. 동시대적 매체 속에서 조각 및 조각적인 것들이라고 불릴 만한 이미지와 사물 등을 관찰 및 탐구하는 데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동시대적 존재를 조각 매체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한다. 주요 작업으로 〈Trinity〉, 〈Snoop Roof〉, 〈PreMix 시리즈〉 등이 있다.
장준호
현 서울시립대학교 예술체육대학 조각학과 교수. 프랑스 마르세유 고등미술학교 조각 전공 학사와 파리1대학 팡테옹-소르본 조형예술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홍익대학교 미술학과에서 조각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7회의 개인전 및 70여 회의 단체전을 통해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활용과 설치미술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활동과 강의를 진행 중이다.
목차
서문
1. 정동을 통한 장소의 사유와 경험의 공감각 (이재원, 고경호)
2. 조르주 바타유의 ‘반건축’ 개념과 베르나르 츄미 건축론으로의 실천 (김맑음, 정연심)
3.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와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작품 속 관계 맺기로 드러나는 ‘소모’ (김윤아, 고경호)
4. 관객참여형 미술작품에서 나타나는 행동유도성에 대한 연구 (김채린, 고경호)
5. 루만의 예술체계이론에 나타난 예술 코드로서의 미와 추 (박영욱)
6. 트릭스터: 시각예술과 문학, 경계 너머의 몸 (고경호, 이주현)
7. 동시대 인체 조각에서 나타나는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데이비드 알트메이드와 올리버 라릭의 작업을 중심으로 (이충현, 고경호)
8.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을 통해 본 예술작품의 장소성 연구 (장준호, 고경호)
9. 가상박물관 플랫폼을 활용한 DMZ의 문화적 확장성 (고경호, 이대철)
10. 복제를 넘어선 변형가능성으로서의 재생산: 발터 벤야민의 <재생산기술시대의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박영욱)
11. 세실리아 비쿠냐의 1960년대 대지미술 연구 (김한들, 정연심)
12. 비개연성과 개연성의 역설로서의 매체: 루만의 매체이론을 중심으로 (박영욱)
13. Borderless DMZ (정연심, 김태현)
14. Abstract
후주
Notes
참고 문헌
논문 출저
도판 출처
저자 소개
출판사 서평
‘스마트 폴리’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탐구하며,
현대 사회에서 공간의 재해석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다
이 책은 ‘스마트 폴리’ 개념을 중심으로 공간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탐구한다. 「조르주 바타유의 ‘반건축’ 개념과 베르나르 츄미 건축론으로의 실천」은 건축적 의미에서 폴리의 개념을 창안한 츄미의 건축론을 철학자 바타유의 반건축 개념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 글은 츄미의 폴리가 지닌 본래적 의미를 잘 드러낸다. 바타유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는 개념이 ‘소모(낭비)’라는 점에서 「펠릭스 곤잘레스-토레스와 리크리트 티라바니자 작품 속 관계 맺기로 드러나는 ‘소모’」는 폴리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현대 조각의 공간적 실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 준다. 「정동을 통한 장소의 사유와 경험의 공감각」은 우리의 의식적 차원 이전에 발생하는 가장 근원적인 몸의 체험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를 탐구한다.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을 통해 본 예술작품의 장소성 연구」 역시 토비아스 레베르거의 작품에서 보여지는 예술작품과 장소와의 관계를 통해서 현대 미술에서 장소성에 관한 해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탐구한다. 「동시대 인체 조각에서 나타나는 재현 방식에 관한 연구: 데이비드 알트메이드와 올리버 라릭의 작업을 중심으로」 역시 시공간의 경계가 모호해진 현대 사회에서 실제 공간을 점하지 않은 수많은 이미지가 어떻게 공간적으로 체험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공간에 대한 중요한 감각으로서 촉각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세실리아 비쿠냐의 1960년대 대지미술 연구」는 대지미술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서 공간과 장소가 어떠한 사회적 맥락을 지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와 전망을 제시한다. 「Borderless DMZ」는 파주시 Uni마루를 비롯해 도라산역, 파주 철거 GP,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 서울 국립 통일 교육원 등 총 5개의 공간에서 진행된 전시에 관한 글로서 DMZ 공간의 사회적, 역사적 장소성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관객참여형 미술작품에서 나타나는 행동유도성에 대한 연구」는 깁슨의 ‘어포던스’ 개념을 중심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작가들의 작품이 어떠한 방식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발하며 상호작용의 공간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트릭스터: 시각예술과 문학, 경계 너머의 몸」은 매튜 바니와 마크 퀸의 매체 미술을 경계의 허물기와 이를 통한 새로운 공간적 체험의 가능성을 다룬다. 「가상박물관 플랫폼을 활용한 DMZ의 문화적 확장성」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박물관 플랫폼을 이용하여 DMZ의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끝으로 「루만의 예술체계이론에 나타난 예술 코드로서의 미와 추」, 「복제를 넘어선 변형가능성으로서의 재생산: 발터 벤야민의 <재생산기술시대의 예술작품>을 중심으로」, 「비개연성과 개연성의 역설로서의 매체: 루만의 매체이론을 중심으로」는 새로운 매체 환경을 통해서 예술이 어떻게 새로운 경험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